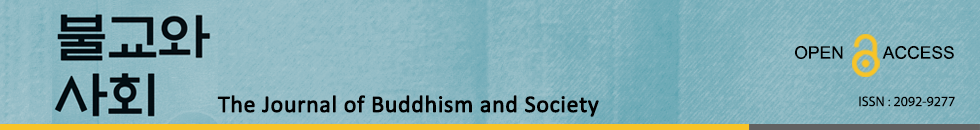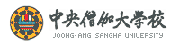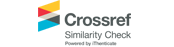Ⅰ. 서론
아비달마 논사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을 삼법인(三法印)으로 요약한다. 『아비달마구사론』(이하 『구사론』)의 저자인 세친(Vasubandhu, 世親, 4-5C頃) 논사 역시 일체법을 3법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불설의 준거로 삼았다. 세친은 제행무상인(諸行無常印)을 유위법에, 열반적정인(涅槃寂靜印)을 무위법에, 제법무아인(諸法無我印)을 일체법에 배대하였다.
한역 『구사론』의 대표적인 주석서를 남긴 신태(神泰, 7C), 보광(普光, 7C), 법보(法寶, 7C) 등은 이 논 전체의 종지(宗旨)가 ‘제법무아(諸法無我)’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설일체유부를 대표하는 『구사론』이 제법무아를 천명한 논서라는 뜻이다.
유부에서는 제법무아 이외에 비아(非我), 공(空), 공관(空觀) 등의 용어로 교설과 수행의 근본 문제를 논한다. 그런데 이들 용어는 대승의 제법개공(諸法皆空) 또는 대승의 공관(空觀)과 같은 용어들과 혼동할 수 있다.1)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구사론』의 종지를 ‘제법무아’로 지칭하는 교설적 근거를 3대소로써 확인하고, 유부를 ‘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이라 지칭한 중국 교판가들의 견해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사론』에서 설해진 ‘공’과 ‘공관’의 용례를 분석하여 이 두 용어는 아소(我所)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소라는 대상에 대한 마음 씀, 수행에 대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Ⅱ. 『구사론』의 제법무아(諸法無我)
전통 3대소에서는 한역 『구사론』을 9품으로 나누고, 9품 전체에 대해 세친의 해석을 근거로 삼법인에 배대하여 해석하였다. 『구사론』 전체의 종지에 대해 『태소(泰疏)』 등 전통 3소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먼저 신태 법사는 『태소』에서 현장 번역의 『구사론』에 의거하여 세친의 삼법인 해석을 근거로 논 전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 논 한 부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9품이니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전해진 것을 따랐다. 세친 보살이 판석하기를 “부처님께서 여러 경을 설하신 것에 3법인이 있으니 일체행무상과 일체법무아와 열반적정이다. 일체의 경법이 이 3종의 이치에 의해 인증된 것이라면 참된 불법이다. 3법인 중에서 일체행무상은 유위에만 국한되고, 열반적정은 무위뿐이니 일부분이지만 제법무아의 이치는 일체의 유위와 무위에 통한다.”라 했다. 그러므로 지금 세친보살이 제법무아의 법인에 근거하여 이 논을 지었다. 9품 중에서 앞의 8품은 ‘제법’을 밝히고, 제9품 한 품은 ‘무아’를 밝힌다.2)
신태(神泰, 7C)는 『구사론』 전체가 ‘제법무아’의 법인에 근거하며, 이 가운데 앞의 8품은 ‘제법’에, 제9품인 「파아품(破我品)」은 ‘무아’에 해당한다고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즉, 『구사론』 전체는 제법에 대한 해석과 제법의 실체 없음을 설한 논서라고 파악한 것이다. 이는 아래 보광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다.
보광(普光, 7C)은 『광기(光記)』에서 역시 3법인에 근거하여 『구사론』 전체의 종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셋째, 품의 전후를 밝힘이란 이 『구사론』 한 부는 모두 9품이 있으니 불경 중의 ‘제법무아’를 해석한다. 앞의 8품은 제법(諸法)의 현상[事]을 밝힌다. 비록 이치[理]도 밝히지만, 많은 부분을 따라 [현상을 밝힌다]고 설한 것이며, 혹은 [이치는] 정식으로 밝힌 것이 아니다. 뒤의 1품은 무아(無我)의 이치[理]를 해석한다. 비록 현상[事]도 밝히지만, 많은 부분을 따라 [이치를 밝힌다고] 설한 것이며, 혹은 [현상은] 정식으로 밝힌 것이 아니다.3)
보광도 『구사론』 전체 9품을 앞의 8품은 제법의 현상을 밝히고, 제9품인 「파아품」은 무아의 이치를 해석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신태의 견해와 다른 점은 앞의 8품을 제법의 현상[諸法事]이라 하고, 뒤의 1품을 무아의 이치[無我理]라고 하여, 현상[事]과 이치[理]로 구분하는 견해를 보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보(法寶,7C)의 『보소(寶疏)』는 『구사론』 전체를 9품으로 나누고 앞의 8품과 뒤의 1품을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식은 같지만, 둘의 명칭을 다르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 법보의 견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둘째, [품의] 순서를 밝힘이란 이 구사론 한 부는 모두 9품이 있다. 앞의 8품은 자기의 종파(유부)의 이치(義)를 서술하여 본송(6백송)의 글을 해석하기 때문에 먼저 밝힌다. 뒤의 1품(「파아품」)은 해석을 지을 때 외도의 주장을 추가하여 논파했기 때문에 뒤에 설한다.4)
즉, 법보는 논 전체의 종지에 대한 언급 없이 논 전체 9품을 자종의 이치를 서술하는 부분[述自宗義]과 외도의 주장을 논파하는 부분[破外執]으로만 구분한 것이다. 이전 두 주석에서 논 전체를 ‘제법’과 ‘무아’ 두 부분을 설한 것으로 나눈 방식과 다르다.
3대소의 해석에 대해 담혜(湛慧,1677-1748)는 『지요초(指要鈔)』에서 다음과 같이 평론하고 있다.
그런데 법보스님의 『보소』는 3법인을 기준하지 않고 다만 자종(自宗)과 타종(他宗)에 나아가 이야기할 뿐이다. 앞의 8품은 자종이고, 제9품은 타종의 주장이다.(자세히는 『보소』 12쪽의 해설과 같다.) 그런데 앞의 8품은 먼저 나오고 제9품은 뒤에 지었으니 「파아품」은 본문을 지을 때 비로소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태소』와 『광기』의 경우는 1부의 9품이 완성된 때를 기준한 것이니 그렇지 않다면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종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5)
담혜에 따르면, 『태소』와 『광기』는 『구사론』 9품 전체를 기준하기 때문에 ‘제법무아’를 종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소』는 본송인 600송을 해석한 앞의 8품과 본문을 지을 때 추가한 제9품을 구분하여 전자는 자종(自宗)을 서술하고, 후자는 타종(他宗)의 주장을 서술한 것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보소』는 앞의 8품과 제9품을 포괄하는 전체의 종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보소』에서 9품 전체의 종지를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으나, 법보 역시 『구사론』 전체를 9품의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태소』와 『광기』의 견해(‘제법무아’)에 대해 법보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설(異說)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보소』의 구분에 의하더라도, 앞의 8품은 자종(설일체유부)의 이치인 제법의 실유(實有)를 서술한 것이며, 제9품 『파아품』에서 외도의 주장을 논파한 것은 결국 무아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3소의 견해를 종합하면 『구사론』 9품 전체의 종지를 ‘제법무아’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쾌도(快道,1751-1810) 역시 『법의(法義)』에서 다음과 같이 개략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논의 종취(宗趣)란 여기에 둘이 있다. 첫째 설명된 이치로서의 종취이다. 둘째 주장된 부파로서의 종취이다. 처음에 공통과 개별이 있다. 무아를 요점으로 밝혀서 인아집(人我執)을 타파하는 것이 공통된 종취이니 다른 부파에도 통하기 때문이다. 75법이 3세(三世)에 실유(實有)하며, 법체(法體)가 항유(恒有)인 것은 개별적인 종취이니 여타의 부파에는 없기 때문이다.6)
쾌도에 따르면, 이 논의 종취는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설명된 이치이고, 둘째는 주장되는 부파이다.7) 첫째 설명된 이치로서의 종취는 다시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으로 나눈다. 공통적인 종취란 무아를 밝혀 인아집(人我執)을 타파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종취란 바로 설일체유부의 고유한 주장인 ‘삼세실유(三世實有) 법체항유(法體恒有)’8)이다.
쾌도의 해석은 결국 『태소』와 『광기』에서 앞의 8품을 ‘제법’과 ‘제법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제9품을 ‘무아’와 ‘무아의 이치’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제법’ 또는 ‘제법의 현상’은 ‘삼세실유 법체항유’라는 개별적인 종취에 해당하고, ‘무아’ 또는 ‘무아의 이치’는 공통적인 종취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통 주소의 해석에 따르면 『구사론』 9품 전체의 종지는 ‘제법무아’로 귀결된다.9) 그렇다면 『구사론』의 ‘제법무아’는 ‘제법개공(諸法皆空)’을 가리키는 것인가? 쾌도는 『구사론』의 무아는 인아집을 타파하는 것이라 설하고 있다.
무아를 요점으로 밝혀서 인아집(人我執)을 타파하는 것이 공통된 종지이니 다른 부파에도 통하기 때문이다.10)
『구사론』에서 제시하는 ‘제법무아’는 인공(人空)을 밝혀 인아집을 타파하는 것이니 아직 법아집(法我執)을 타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담혜의 설명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제법무아’라 한 것은 대승의 관점에서 논한다면 인공(人空)의 범위일 뿐이지 대승의 이른바 법공(法空)의 이치가 아니다. 저 소승종은 유위와 무위의 일체 법에 모두 주재자가 없음을 ‘제법무아’라 한다. 또한 유부 등에서 ‘삼세실유 법체항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법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4아함경에서 법공을 일부분 설하고 있지만, 교설의 정식적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해석하지 않는다.(경에서 ‘이러한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고 죽는 누군가도 없다[無是老死 無誰老死]’라 하니, 청량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12인연의 인공과 법공의 뜻을 밝힌 것이다. ‘늙음과 죽음이다[是老死]’란 노사의 법체를 가리킨다. ‘누군가[誰]’란 바로 인(人)이다. ‘늙음과 죽음이 없다[無是老死]’란 노사의 법공이다. ‘늙고 죽는 누군가가 없다[無誰老死]’란 노사를 주재하는 인(人)이 공한 것이다.) 화엄과 법상 등의 여러 대승종에선 이를 가리켜 ‘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이라 하며, 혹은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이라 하니 여기에서 유래한다.
또한 현수 등에 근거하면 비바사와 구사 등의 논은 우법성문교(愚法聲聞教)이니 법[공]에 우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가의 성문지 등에서 밝힌 번뇌를 끊고 이치를 증득하는 견도 · 수도 등의 모습과는 다르니 학자들은 밝게 분별해야 한다.11)
담혜의 『지요초』에 따르면, 『구사론』의 ‘제법무아’는 인공을 밝힐 뿐 아직 대승의 제법개공의 도리에 미치지 못한다. 설일체유부는 ‘삼세실유 법체항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법공(法空)을 설하지 않는다. 비록 4아함에서도 법공의 이치가 나타나지만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지 삼장교(三藏敎)의 정식적인 이치는 아니다.
담혜는 징관(澄觀,738-839)의 『화엄소초(華嚴疏鈔)』를 인용하여 아함에서도 법공과 아공을 함께 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승의 교판(敎判)에 따르면 ‘법유아무종(法有我無宗)’ 또는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이라 하니 법의 실유를 설하여 법집(法執)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우법성문교(愚法聲聞教)’라 하니 법공의 이치에 어리석기 때문이다.
담혜가 인용한 징관의 『화엄경소(華嚴經疏)』와 『화엄경소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아함경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늙음과 죽음도 없고”라 한 것은 곧 법공(法空)이고, “늙고 죽는 누군가도 없다”라 한 것은 생공(生空)이다.12)
소(疏)의 ‘또한 아함경에서 말하기를’아래는 두 번째로 소승경을 인용한다. 그러나 경문에서 이어서 말하기를 “이러한 늙음과 죽음도 없으며, 늙고 죽는 누군가도 없다.”라 하였으니, 이것은 12인연의 인공과 법공의 이치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늙음과 죽음’이란 늙음과 죽음의 법체를 가리키고 ‘누군가’란 바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늙음과 죽음도 없다’란 바로 늙음과 죽음이란 법이 공한 것이고, ‘늙고 죽은 누군가도 없다’란 바로 늙음과 죽음을 주관하는 아인(我人)이 공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경론에서 대부분 소승은 인공(人空)만 있고 법공(法空)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대부분과 일부분을 따라 설한 것이니 소승은 대부분 인공만을 밝힌다. 둘째는 드러냄과 드러내지 않음을 따라 설한 것이니 비록 법공을 설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공을 설하지 않는다’라 하는 것이다. 드러내지 않은 설과 일부분의 설을 따른다면 역시 법공도 밝힌 것이니, 지금은 이 뜻에 따른다.13)
징관은 『화엄소초』에서 여러 논사의 교판을 해석하면서 소승교인 아함에도 아공과 법공의 이공(二空)이 있음을 드러내고자 『성실론(成實論)』과 『아함경(阿含經)』과 『대지도론(大智度論)』의 문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아함경』에서 십이연기를 설한 ‘無是老死 無誰老死’의 대목을 인용하여 ‘無是老死’는 법공에 해당하고, ‘無誰老死’는 아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경론에서 소승을 인공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설과 드러낸 설에 따르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비록 일부분에 불과하며 확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법공의 이치도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소승교인 아함도 2공을 설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판에 따르면 소승교는 ‘법유아무종’ 또는 ‘수상법집종’ 등으로 분류되며, ‘우법(愚法)’이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법상종(法相宗)의 규기(窺基, 632-682)와 화엄종(華嚴宗)의 법장(法藏, 643-712)과 종밀(宗密, 780-841)은 유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먼저 ① 규기의 『백법명문론해(百法明門論解)』, ② 법장의 『화엄오교장(華嚴五敎章)』과 ③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④ 종밀의 『원각경대소(圓覺經大疏)』에 따르면,
① 종지로 삼는 대상을 연구할 경우, 일대(一代)의 성교를 총괄하여 깊이로 순서를 매기면 8종으로 나뉜다. … 둘째는 법(法)은 있고 아(我)는 없는 종이다. 3부의 전체를 포함하니 일체유부와 설산부와 다문부이다. 다시 화지부의 말파가 주장하는 일부분의 뜻도 겸한다.14)
② 이치로서 종을 분류하면 종에 10종이 있다. … 중략 … 둘째는 법은 있고 아는 없는 종이니 살바다 등이다. 그들은 온갖 법은 2종에 포함된다고 설하니 첫째는 명(名)이고 둘째는 색(色)이다. 혹은 4종에 포함되니 3세와 무위이다. 혹은 5종이니 첫째는 심이고, 둘째는 심소이고, 셋째는 색이고, 넷째는 불상응이고, 다섯째는 무위이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모두 실유이다.15)
③ 지금 동쪽으로 전해진 일체의 경론은 대소승을 통틀어 종지로 삼는 길(宗途)이 4종이 있다. 첫째는 모습을 따라 법에 집착하는 종이니 소승의 온갖 부파가 이것이다.16)
④ 지금 5교를 기준하여 방편[權]과 진실[實]을 상대하여 드러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첫째는 법에 어리석은 성문교(愚法聲聞教)이다. 일심(一心)을 가립하여 설하니 외경이 실유하여 다만 마음이 온갖 업을 지음으로 인해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유심(唯心)’이라 하지만 그대로 마음인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유종(有宗)이 12처의 교설에 의지하여 마음과 경계가 모두 존재한다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식론』에서 논파하기를 “다시 유식의 이치에 미혹하여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외경이 식(識)과 같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집착한다.”라 하였다.17)
규기는 『백법명문론해』에서 일대성교를 8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은팔종(慈恩八宗)이라 한다. 8종에서 두 번째인 ‘법유아무종’은 설일체유부·설산부·다문부를 포함하여 화지부의 말파에서 일부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장은 『화엄오교장』에서 5교 10종의 교판을 제시하고 있는데, 10종에서 두 번째인 ‘법유아무종’은 살바다 곧 설일체유부 등에 해당하니 일체법을 5위로 분류하며 실유라 주장한다. 또한 『기신론의기』에선 소승의 여러 부파를 통틀어 ‘수상법집종(隨相法執宗)’이라 분류하니 법집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밀은 『원각경대소』에서 5교를 분류하여 권교(權敎)와 실교(實敎)를 드러내면서 첫째로 ‘우법성문교(愚法聲聞敎)’를 제시한다. 이들은 마음 밖에 별도의 실유로서 외경이 존재하고 이러한 외경은 마음이 짓는 업에 의해 초래한 것이라 여기니 유심(唯心)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유심의 이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12처설 등에 의지하는 유종(有宗)이니 마음과 경계가 모두 실유한다고 주장한다. 『성유식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유식(唯識)의 이치를 알지 못하여 외경(外境)이 식(識)처럼 존재하는 것이라 집착한다’고 평가한다.18) 이들은 법공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법(愚法)’이라 한다. ‘우법’이란 법공에 어리석다는 뜻이다.19)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구사론』의 ‘제법무아’는 법공이 아닌 아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법무아’란 ‘제법(諸法)은 실유하지만 실아(實我)는 존재하지 않는다.’라 해석해야 한다. 3세에 걸쳐 실유하는 5온·12처·18계에는 상일주재(常一主宰)하는 실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사론』의 제법무아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온·처·계일뿐 거기에는 어떠한 실아적인 존재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5온을 예시하면, 존재하는 것은 3세에 걸친 색·수·상·행·식 5온일 뿐이며, 5온 어디에서도 상주하고[常] 단일하고[一] 자재한[主宰]실아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부의 제법무아는 제법은 존재하지만 실아는 없다는 뜻의 ‘법유아무종’으로 표현된다.
Ⅲ. 『구사론』의 공관(空觀)
그렇다면 『구사론』에서는 ‘무아’만을 설하고, ‘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사론』 ① 권23, ② 권26, ③ 권29 등에서는 ‘공’을 언급한 서술을 볼 수 있다.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 관행자는 소연이 모두 섞인 법념주에 머물면서 소연인 신(身) 등의 4종 경계를 총괄하여 관찰하여 4종 행상을 닦으니 이른바 비상(非常)과 고(苦)와 공(空)과 비아(非我)이다.20)
② 이치에 맞는 설은 실체 역시 16종이다. 고성제에 4종 행상이 있으니 첫째는 비상(非常), 둘째는 고(苦), 셋째는 공(空), 넷째는 비아(非我)이다.21)
③ 공삼마지(空三摩地)란 공(空)과 비아(非我)의 2종 행상과 상응하는 등지(等持)이다.22)
첫째 인용문은 『구사론』 「현성품(賢聖品)」 권23에서 4념주(四念住) 중 총잡념주(總雜念住)의 4행상(行相)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신(身)·수(受)·심(心)·법(法)의 4종 경계에 대해 비상(非常)·고(苦)·공(空)·비아(非我)의 4행상을 함께 관찰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행상’이란 인식의 주체(能緣)인 심·심소가 인식의 대상(所緣)을 파악하여 이해하는 모습이다.
둘째는, 「지품(智品)」 권26에서 무루지(無漏智)가 4성제(四聖諦)를 관찰하는 16행상(十六行相)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고·집·멸·도 4제에 각기 4종 행상이 있어서 16행상이 되니, 고성제의 4행상은 비상·고·공·비아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품(定品)」 권29에서 공해탈문(空解脫門)과 상응하는 2행상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공해탈문을 닦을 때는 공과 비아의 행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4념주를 닦을 때와 4성제를 관찰할 때와 공해탈문을 닦을 때 ‘공관’이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대상[所緣]을 ‘공’의 행상으로 관찰하는 ‘공관’을 유부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사론』에서 언급한 이러한 공관은 대승의 ‘제법개공’의 공관과 다른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공’이란 용어는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대승의 ‘공’은 무자성(無自性)을 가리키고, 유부의 ‘공’은 무아소(無我所)를 가리킨다. 『구사론』과 여러 주소(註疏)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을 설명하고 있다.
① 즉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상이고, 핍박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고이고, ‘나의 것[我所]’이라는 견해와 위배되기 때문에 공이고, ‘나[我]’라는 견해와 위배되기 때문에 비아이다.23)
② ‘상주한다[常]’는 견해를 대치하기 위해 ‘비상’의 행상을 닦는다. ‘즐겁다[樂]’는 견해를 대치하기 위해 ‘고’의 행상을 닦는다. ‘나의 것[我所]’이라는 견해를 대치하기 위해 ‘공’의 행상을 닦는다. ‘나[我]’라는 견해를 대치하기 위해 ‘비아’의 행상을 닦는다.24)
③ 묻겠다. 공삼마지에는 ‘공’과 ‘비아’ 2종 행상이 있으며, 유신견에는 ‘나[我]’와 ‘나의 것[我所]’ 2종 행상이 있다. 이 중에서 어떤 행상으로 어떤 행상을 대치하는가? 답한다. ‘비아’의 행상으로 ‘아(我)’의 행상을 대치한다. ‘공’의 행상으로 ‘아소(我所)’의 행상을 대치한다.25)
④ 묻겠다. 고제 아래의 1행상은 어떤 행상을 남겨두는 것인가? 답한다. 견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가지 수행자가 있다. 첫째는, 이근(利根)이니 견행(見行)이다. 견행에 둘이 있다. ‘나[我]’에 집착하는 자는 ‘무아’의 행상을 남겨두고, ‘나의 것[我所]’에 집착하는 자는 ‘공’의 행상을 남겨둔다. 둘째는, 둔근(鈍根)이니 둔근 역시 둘이 있다. 아만이 증장한 자는 ‘무상’의 행상을 남겨두고, 해태가 증장한 자는 ‘고’의 행상을 남겨둔다.26)
①은 『구사론』 「지품(智品)」 권26에서 고제의 4행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일체의 유루법은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고제(苦諦)라 한다. 이러한 고제의 ‘비상(非常)’은 조건[緣]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고(苦)’는 핍박되는 성질이기 때문이며, ‘공(空)’은 ‘나의 것[我所]’이란 견해와 위배되기 때문이며, ‘비아(非我)’는 ‘나[我]’라는 견해와 위배되기 때문이다.
②는 『광기』에서 고제의 4종 행상이 대치하는 견해를 설명한 내용이다. 비상은 ‘상주한다’는 견해를 대치하고, 고는 ‘즐겁다’는 견해를 대치하고, 공은 ‘나의 것’이라는 견해를 대치하고, 비아는 ‘나’라는 견해를 대치한다.
③은 『광기』에서 공삼마지(空三摩地)의 2종 행상이 대치하는 대상을 설명한 내용이다. 공삼마지와 상응하는 ‘공’과 ‘비아’의 행상은 5견 중 신견(身見)에 존재하는 아(我)와 아소(我所)의 행상을 대치한다는 것이다.
④는 『송소』에서 견도(見道) 이전의 세제일법(世第一法)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고제의 1행상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4가행위(加行位)에서 견도에 들어가기 직전의 세제일법의 단계에서 수행자는 근기와 번뇌에 따라 고제의 4행상 중에서 1행상을 남겨놓는다. 우선 이근의 수행자는 ‘무아’와 ‘공’의 행상을 남겨두고, 둔근의 수행자는 ‘무상’과 ‘고’를 남겨둔다. 이근에서 다시 번뇌의 경중에 따르니 ‘나’에 집착하는 자는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 ‘무아’의 행상을 남기고, ‘나의 것’에 집착하는 자는 ‘공’의 행상을 남겨둔다. 둔근 역시 번뇌에 따라 ‘아만’이 증장한 자는 ‘무상’을 남겨두고, ‘해태’가 증장한 자는 ‘고’를 남겨둔다.
이상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사론』에서 언급하는 ‘공관’은 신견의 일부분인 ‘나의 것(我所)’에 대한 견해를 대치한다는 것이다. 곧 유부의 공은 ‘무아소(無我所)’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의 공이 연기(상호의존)에 근거한 ‘무자성(無自性)’을 가리키는 것과 차이가 있다. 5온으로 예시하면, 유부의 ‘5온개공(五蘊皆空)’은 ‘5온무아소(五蘊無我所)’이니 5온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나의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승의 ‘5온개공’은 ‘5온무자성(五蘊無自性)’이니 5온 자체가 실체적인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견(我見)을 대치하는 ‘비아’와 아소견(我所見)을 대치하는 ‘공’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설일체유부의 적전자(嫡傳者)로 칭해지는 중현(Saṃghabhadra, 衆賢,4-5C頃)은 『순정리론(順正理論)』 권79에서 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삼마지(空三摩地)는 ‘공’ · ‘비아’ 2종 행상과 상응하는 등지(等持)이다. 그러므로 공의 등지가 유신견(有身見)을 가깝게 대치한다고 설한 것이다. 유신견에도 2종 행상이 있기 때문이니 공의 행상은 ‘나의 것이란 견해[我所見]’를 가깝게 대치하고, 비아의 행상은 ‘나라는 견해[我見]’를 가깝게 대치한다. ‘[이러한] 법이 내[我]가 아니다’라 관찰하는 것을 ‘비아의 행상’이라 하고, ‘이러한 [법] 중에는 나[我]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無我]’라 관찰하는 것을 ‘공의 행상’이라 한다.
이 공의 행상으로 인해 ‘나의 것’이란 견해를 가깝게 대치하면, 이러한 [법] 중에는 ‘나’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나의 것’이 아닌 것[非我所]이니 어찌 공의 행상이 그대로 비아의 행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법이] 나가 아님’과 ‘이러한 법 중에 내[我]가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2종 행상이 결국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지 않다. “이러한 [법] 중에 내[我]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말한 것은 ‘나[我]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만 저것과 이것이 서로 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드러낼 뿐이지, ‘궁극적으로 나[我]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 없으니, 실체가 있는 법도 서로 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은 내가 아니다[非我]”라 말하는 경우라면 ‘나[我]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바로 드러내니 일체의 법은 법상(法相)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아’의 행상을 닦으면 바로 ‘아견’을 대치하고, ‘공’의 행상을 닦으면 ‘아소견’을 대치하니 어찌 차별이 없는가?27)
공삼마지의 ‘비아’와 ‘공’의 행상은 유신견의 ‘나[我]라는 견해’와 ‘나의 것 [我所]이라는 견해’를 대치한다. 질문의 내용은 ‘비아의 행상과 공의 행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중현은 질문을 설정하면서 우선 ‘나[我]’와 ‘나의 것[我所]’을 통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의 행상은 ‘나의 것이 없음[無我所]’을 가리킨다. 또한 비아의 행상은 ‘내[我]가 아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중현은 ‘나’와 ‘나의 것’을 통합하여 ‘나의 것이 없음[無我所]’이라는 ‘공’의 행상을 ‘내가 없음[無我]’까지 포함하여 규정한다. 또한 ‘내가 아님’이라는 ‘비아’의 행상을 ‘나의 것이 아님[無我所]’까지 포함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아’와 ‘공’의 차이에 대한 질문은 ‘비아(非我)’와 ‘무아(無我)’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
중현에 따르면 ‘무아’라는 말은 ‘나[我]’의 궁극적인 비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비아’라는 말이어야 궁극적인 비존재를 드러낸다. ‘무아’란 이러한 법 중에 ‘내[我]’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비아’란 이러한 법은 ‘내[我]’가 아니라는 것이다.
‘무아’는 ‘이러한 법(A)에는 저러한 법(B,我)이 존재하지 않는다[A無B, A非有B]’라는 형식을 지닌다. 곧 A에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A와 B가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드러낼 뿐 B의 비존재를 궁극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 권오민의 설명에 따르면 마치 “물에 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와 같다. 이것은 다만 ‘물’에는 ‘불’이 없으며, ‘불’에는 ‘물’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 ‘불’과 ‘물’이 실체로 존재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러한 말은 ‘불’의 비존재성을 드러낼 수 없다.28) 예를 들어 ‘5온무아’를 설할 경우에, ‘5온’은 A에 해당하고, ‘나[我]’는 B에 해당한다. 이것은 ‘5온’에 ‘내[我]’가 없다는 것이지 ‘나’라는 것의 궁극적인 비존재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
‘비아’는 이러한 법(A)은 저러한 법(B, 我)이 아니다[A非B, A非是B]’라는 형식을 지닌다. 이것은 A는 B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현에 따르면 ‘비아’의 형식은 ‘나[我]’의 궁극적인 비존재를 드러낼 수 있으니 그 이유를 일체의 법은 법상(法相)이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권오민의 해설에 따르면, 이러한 법(A)만이 ‘내(B,我)’가 아닐 뿐 아니라 일체의 법이 ‘내[我]’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체의 법이 모두 ‘내[我]’가 아니라면, 결국에 ‘나[我]’라는 법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나’의 궁극적 비존재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29) 중현에 따르면, ‘비아’는 ‘나’(我)의 무실체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무아’는 그렇지 못하다.
중현은 이러한 ‘비아’와 ‘무아’의 구도를 다시 ‘비아’와 ‘공’의 구도로 환원하여 답변을 마친다. ‘비아’의 행상은 ‘나’의 무실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견(我見)을 대치하고, ‘공’의 행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소견(我所見)을 대치한다는 것이 중현의 결론이다.
중현의 설명에서 핵심적인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아’의 행상은 ‘내[我]가 아님’이고, ‘공’의 행상은 ‘나의 것[我所]이 없음’인데, 어째서 ‘나[我]’와 ‘나의 것[我所]’을 통합하여 ‘나의 것이 아님’을 ‘비아’의 행상으로 규정하고, ‘내가 없음’을 ‘공’의 행상으로 규정했는가? 중현은 ‘비아-공’의 구도를 ‘비아-무아’의 구도로 바꾸어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변형을 가한 것이다.
둘째, 어째서 ‘무아’는 ‘나’의 궁극적 비존재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비아’는 ‘나’의 궁극적 비존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가? 무아는 ‘A에는 B(我)가 없다’의 형식이니 A와 B의 실체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我)의 비존재성을 드러낼 수 없다. 비아는 ‘A는 B(我)가 아니다’의 형식이다. A는 B가 아니며, 여타의 일체의 법 역시 법성이 평등하여 A와 같이 B가 아니다. 이에 따라 B(我)의 비존재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중현은 어째서 ‘일체의 법은 법상(法相)이 평등하기 때문이다[以一切法法相等故]’라는 이유를 ‘비아’에만 적용하고, ‘무아’에는 적용하지 않는가? ‘A는 B가 아니다. 여타의 일체법도 A와 같이 법상이 평등하기에 B가 아니다.’라 한다면, ‘A에는 B가 없다. 여타의 일체법도 A와 같이 법상이 평등하기에 B가 없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현이 제시한 ‘비아’와 ‘무아’의 차이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일체의 법이 B가 아님’과 ‘일체의 법에 B가 없음’은 모두 B의 궁극적 비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일체비아(一切非我)’와 ‘일체무아(一切無我)’는 ‘나[我]’의 비존재성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중현은 ‘비아’와 ‘무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비아’에만 ‘법상평등(法相平等)’을 적용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아-공’의 구도를 ‘비아-무아’의 구도로 변형한 시도 역시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우선 ‘제법무아(諸法無我)’와 ‘제법비아(諸法非我)’에서 전자는 ‘일체법에는 내[我]가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일체법은 내[我]가 아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체법(一切法)’을 제외하면 어떠한 법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체법에 내가 없음’과 ‘일체법이 내가 아님’은 모두 ‘나[我]’의 궁극적인 비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음으로 ‘5온무아(五蘊無我)’와 ‘5온비아(五蘊非我)’에서 전자는 ‘5온에는 내가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5온은 내가 아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5온을 제외한 다른 법에는 ‘내[我]’가 존재할 수 있으니 중현의 설명과 같다. 후자의 경우, 5온은 ‘내[我]’가 아니지만 5온을 제외한 다른 법은 ‘나[我]’일 수 있다. 만약 여기에서 중현처럼 ‘법상평등’을 적용한다면, 전자의 경우도 ‘법상평등’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둘 모두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5온무아’와 ‘5온비아’는 모두 ‘나’의 궁극적인 비존재성을 드러낼 수 없다. 둘 모두에 적용한다면 ‘5온무아’와 ‘5온비아’는 ‘제법무아’와 ‘제법비아’와 같게 되어 모두 ‘나[我]’의 궁극적인 비존재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30)
이렇듯 ‘비아’와 ‘무아’가 차이가 없는 것이라면, 결국 ‘비아’와 ‘공’도 역시 차이가 없게 된다. 중현에 따르면 ‘비아’는 ‘나가 아님’과 ‘나의 것이 아님’을 포함하고, ‘공’은 ‘나의 것이 없음’과 ‘내가 없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중현은 ‘비아’와 ‘공’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나[我]와 ‘나의 것[我所]’을 통합하여 ‘비아-공’의 구도를 ‘비아-무아’의 구도로 변형하였으나, ‘법상평등’을 ‘비아’에만 치우쳐 적용함으로 인해 결국에 ‘비아’와 ‘공’ 역시 차이가 없게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을 통합하여 ‘비아’와 ‘공’의 행상에 함께 적용한 중현의 시도 역시 무리수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제법비아’와 ‘제법무아’가 차이가 없다면 ‘비아’의 행상과 ‘공’의 행상도 차이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 애초에 ‘나[我]’와 ‘나의 것[我所]’을 통합하지 않으면 된다. 비아의 행상은 ‘내[我]가 아님’이고, 공의 행상은 ‘나의 것[我所]이 없음’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비아’와 ‘무아’가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면 ‘내가 아님’과 ‘내가 없음’은 ‘비아’의 행상으로 통합할 수 있고, ‘나의 것이 없음’과 ‘나의 것이 아님’은 ‘공’의 행상으로 통합할 수 있다. 곧 ‘아[我]’와 ‘아소[我所]’는 통합할 수 없지만, ‘아님[非]’과 ‘없음[無]’은 통합할 수 있다.31) 이것은 중현의 시도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답은 지민(智敏, 1927-2017)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나의 것[我所]’이라는 견해와 위배되기 때문에 공(空)이고”란 ‘나의 것’이 없음을 ‘공’이라 한다. “‘나[我]’라는 견해와 위배되기 때문에”란 ‘나’라는 그 자체가 없이 ‘비아(非我)’이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하나는 ‘나’이니 이 둘에 대응하여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비아’이다. 그렇다면 ‘나의 것’과 ‘나’는 무엇을 말하는가? 간단히 비유하면 방의 안쪽이 비어있는 것, 방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방이니 안 쪽에 저장된 물건이 비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쪽에 물건이 없는 것을 ‘비어있음[空]’이라 설한다. 방마저도 없는 것을 ‘비아(非我)’라 한다. 나[我]도 그러하니 사람[人], 주재하는 내[我]가 없는 것이 ‘비아’이다. 나의 것이 없는 것, 나의 물건 · 나의 손 · 나의 눈 · 나의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 등에 이르기까지 나의 느낌 · 나의 생각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것[我所]’이 빈 것이라 하니 ‘공이’라 한다. 이러한 고제(苦諦)에는 4개의 행상이 있으니 비상 · 고 · 공 · 비아이다. ‘공’과 ‘비아’의 2종 행상에 대한 유부의 해석은 ‘공’은 다만 ‘나의 것[我所]’을 비운 것이고, ‘비아’는 그러한 ‘나[我]라는 견해’를 대치하는 것이다.32)
지민의 비유에 따르면, 방에 물건이 없이 텅 비어있음을 ‘공’이라 하고, 방 그 자체가 없음을 ‘비아’라 한다. ‘공’이란 방의 ‘부재’가 아니라 방의 ‘비어있음’이다. 이러한 유부의 해석은 공(空, śūnya)의 어원적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반면에 ‘비아’란 방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니 방의 ‘부재’를 가리킨다. 이것은 ‘비아’를 ‘무아’로 해석한 것이다. ‘비아’와 ‘무아’가 전혀 다른 것이라면 ‘비아’는 방의 ‘부재’인 ‘방이 없음’이 아니라 방의 ‘부정’인 ‘방이 아님’이라 해석해야 한다. ‘공’이란 방이 비어있음이니 방은 존재하지만 방안에 물건이 없는 것이다. 곧 ‘나의 것’이 없는 것 나의 소유가 없는 것이다. ‘비아’는 방 그 자체가 없는 것이니, ‘나’라는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이란 결국 ‘나의 것’, ‘나에게 소속된 것’에 대한 부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부의 ‘공관’과 ‘공’은 결국 ‘무아’ 곧 ‘제법무아’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인 것이다.
Ⅳ.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의 주석에 따르면 『구사론』 9품의 전체 종지는 삼법인 중 ‘제법무아’에 해당한다. 앞의 8품은 ‘제법’, ‘제법 실유’를 밝히고, 뒤의 제9품은 ‘무아’, ‘무아의 이치’를 천명한다.
둘째, 『구사론』의 종지인 ‘제법무아’는 ‘인공’을 밝혀 ‘인아집’을 타파하는데 중점을 두니 ‘법아집’을 타파하는 대승의 ‘법공’은 아직 설하지 않는다.
셋째, 중국불교의 화엄가와 법상가 등의 교판에선 이러한 유부의 교설을 법유아무종·수상법집종·우법성문교라 명칭하였다. 그 이유는 ‘아공’을 설하여 ‘실아’를 부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법의 실유’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넷째, 유부의 ‘제법무아’는 온·처·계인 제법은 실유하지만, 거기에는 상일주재하는 내[我]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의 ‘제법개공’이 제법의 자성을 부정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다섯째, 『구사론』에서도 ‘공관’을 설하고 있는데, 이 때 ‘공’의 행상은 ‘비아’의 행상과 함께 짝을 이룬다. ‘비아’와 ‘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아’는 ‘내[我]가 없음’을 가리키고, ‘공’은 ‘나의 것[我所]이 없음’을 가리킨다. ‘비아’의 ‘내가 없음’이란 결국 ‘무아’를 가리키니, 이는 유부의 ‘공관’과 ‘공’은 결국 ‘무아’ 곧 ‘제법무아’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결론하면, 유부의 ‘제법무아’는 ‘아견’을 대치하는 ‘비아’의 행상이니 ‘일체법에 내[我]가 없음’을 가리킨다. 또한 유부의 ‘제법공’은 ‘아소견’을 대치하는 ‘공’의 행상이니 ‘일체법에 나의 것[我所]이 없음’을 가리킨다. 유부의 ‘제법무아’는 ‘실유하는 제법(蘊處界)에는 상일주재하는 내[我]가 없다’는 것이다. ‘제법공’은 ‘나의 것·나의 소유[我所]가 없다’는 것이 ‘제법무아’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유부의 해석은 법집을 대치하는 대승의 ‘일체개공’, ‘제법개공’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이다. 5온으로 예시하면, 유부의 ‘제법무아’는 오직 5온만 존재할 뿐이며, 거기에는 상일주재하는 실유의 내[我]가 없다는 것이며, 유부의 ‘공’은 이러한 5온에는 ‘나의 것[我所]’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승의 ‘제법개공’은 5온인 색·수·상·행·식 그 자체가 의존관계[緣起]에 의해 발생한 법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無自性] 공(空)하다는 것이다. 일부의 해석에서 유부의 ‘공’과 대승의 ‘공’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유부와 대승의 교판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