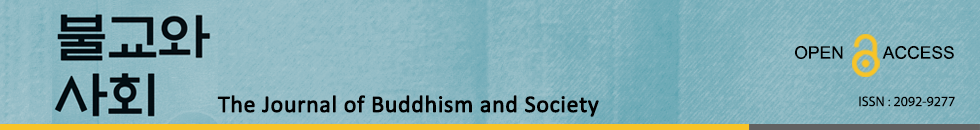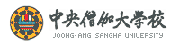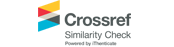Ⅰ. 서언
대한불교관음종(大韓佛敎觀音宗, 이하 관음종)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을 종조로 하여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다. 종조 대각국사의 법맥은 경운 원기(擎雲元奇, 1852-1936)를 거쳐 개산조인 태허 홍선(太虛弘宣, 1905-1979)에 이른다. 태허 홍선은 1957년 법화사상계통을 규합하여 ‘일승불교현정회(一乘佛敎縣正會)’를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는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여러 불교계 종단이 창종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허 홍선은 1965년 ‘대한불교불입종포교원’으로 정부 등록을 하며 창종을 했고, 1972년 ‘대한불교불입종(大韓佛敎佛入宗)’으로 변경한다. 이후 대한불교불입종(이하 불입종) 내에 분종이 발생하면서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이 출범했으며, 이듬해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라는 법인 체제를 갖춘다.
한국불교종단들은 종헌을 제정하여 종단의 최고 상위법으로 지킨다. 종헌은 국가의 헌법에 상응한다. 관음종은 불입종에 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종헌도 불입종에서 시작된다. 이에 관음종의 최초 종헌은 불입종이 1965년 12월 8일 제정한 <불입종 종헌>이다. 이 종헌은 1972년 4월 8일 <대한불교불입종 종헌>으로 개정되었으며, 1979년 4월 8일 재개정되었다. <대한불교불입종 종헌>은 관음종이 출범함에 따라 1988년 8월 9일에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으로 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1월 22일에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본고에서는 1965년 12월 8일 제정한 <불입종 종헌>을 ‘최초 종헌’으로, 1972년 4월 8일 개정된 <대한불교불입종 종헌>을 ‘1972년 종헌’으로, 1979년 4월 8일 재개정된 종헌을 ‘1979년 종헌’으로, 1988년 8월 9일에 개정·공포된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을 ‘1988년 종헌’으로, 2003년 1월 22일에 개정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을 ‘현재 종헌’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아울러 종단의 명칭도 해당 시기에 따라 불입종과 관음종을 각각이 사용할 것이며, 교정원장과 총무원장의 명칭도 그러한 방식으로 명명할 것이다.
관음종과 불입종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산조인 태허 홍선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태허 홍선의 생애와 사상-한국불교사적 지위와 한국불학사적 위상」(고영섭, 『한국사상사학』, 2011), 「관음종의 개창 조사 태허의 법통 인식과 그 특징」(차차석, 『禪學』, 2015), 「태허 홍선의 현실 인식과 불입종 창종」(고영섭, 『진단학보』, 2018)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연구 이외 관음종과 불입종의 연구는 한국불교의 법화계 종단을 분석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는데, 「한국 법화계 불교종단의 역사와 성격」(민순의, 『불교문예연구』, 2020)과 「한국불교 법화계 종단의 예송의례」(전영숙, 『불교문예연구』, 2021) 등이 그러하다. 근래에는 창종 60주년을 맞이하여 「관음종의 立宗과 그 실현」(이성운·조희연, 『불교철학』, 2024)과 「탈종교화시대, 관음종의 사회적 실천: 말세의식과 공생적 이타행」(장미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25) 등 관음종의 시대적 역할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고는 관음종의 종헌과 종무권한[종권]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한국불교학계에서 종헌 등 종단제도나 종권 등 종단정치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관음종 종무권한[종권]의 변화를 중심으로 종헌의 변천을 분석하는데 있다. 종무권한 변화의 핵심은 종정과 교정원장·총무원장이 보유한 각각의 인사권과 재정권이다. 종정과 교정원장·총무원장 이외에 중앙종무기관인 종회, 호법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권한과 지방종무기관인 교구, 사찰, 주지의 종무권한도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재정·회계와 포상·징계에 관련된 종무권한도 살펴본다.
Ⅱ. 종정과 교정원장·총무원장
불입종 창종 시 종정은 신성성과 실무권을 가진 종단의 대표권자였지만, 현재는 종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총무원장[교정원장]은 창종 시에는 행정기관을 대표하던 존재였으나, 현재는 관음종 종단을 통리하는 실무권을 가진 대표권자가 되었다. 본장에서는 양자 간 종무권한의 이동을 종헌의 변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종정은 최초 종헌에서 불입종을 대표하며, 종단을 통할할 수 있는 종무권한을 부여받는다(<1965년 종헌> 제9조). 종정의 임기는 종신제였는데(<1965년 종헌> 제10조), 태허 홍선이 개산조임을 고려한 조항으로 보인다. 종정의 계승은 당시 종정이 적합한 후임자를 위촉하는 방식이었으며, 위촉이 없을 시에는 종회에서 선임추대했다(<1965년 종헌> 제10조). 종정은 불입종의 종지 및 교풍에 위배되는 종회의 결의를 호법원의 재심을 거쳐 거부할 수 있었으며, 불순하다고 확인되는 종회의원 일부의 소환 또는 종회의 전원 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다(<1965년 종헌> 제11조). 종정은 행정부의 수장인 교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호법원장, 그리고 기타 임원의 임면권을 가진 불입종의 최고 인사권자였다(<1965년 종헌> 제12조). 종정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을 임면할 수 있는 인사권자였던 것이다. 또한 종정은 입법부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종회의원 소환과 종회 해산의 권한이 있었다. 이에 최초 종헌상 종무권한의 구조는 3권분립을 넘어선 종정중심제였으며, 이는 개산조인 태허 홍선이 종정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972년 종헌에서는 초대 종헌에 없었던 초대 종정은 창종주가 임(任)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1972년 종헌> 제8조). 창종주는 개산조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태허 홍선을 종정에 임하기 위한 조항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1972년 종헌에서도 종정의 임기는 역시 종신제였다(<1972년 종헌> 제10조). 또한 종정의 계승에 있어서도 당시 종정이 후임자를 위촉하고, 그 위촉이 없을 시에는 종회에서 추대했다. 다만 당대 종정의 위촉이 없이 종회에서 추대를 하는 경우에는 <종정추대법>에 의하여 종정을 추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1972년 종헌> 제10조).
이외에도 1972년 종헌은 종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신설하였다. 최초 종헌에서 규정한 종정의 종단 대표권, 종단 통할권, 종단 임면권(교정원장, 호법원장, 기타 임원), 종회 결의 거부권, 종회 해산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하여 1972년 종헌은 종단 소속 사원 및 종단기관의 재산 감독권과 그 처분 승인권(<1972년 종헌> 제11조), 그리고 종단 소속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와 징계의 사면 및 경감, 복권에 대한 권한을 신설하였다(<1972년 종헌> 제13조).
1979년 종헌은 최초 종헌과 1972년 종헌에서 규정한 종정의 권한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종정의 임기만은 ‘종신제’에서 ‘10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도록 약화했다(<1979년 종헌> 제10조). 개산조인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라 그 후임 종정에 대해서는 종신제를 폐지한 조치이다. 그런데 1979년 종헌의 공포일이 4월 8일이고, 태허 홍선의 입적일이 6월 24일임을 고려할 때, 종정 종신제 폐지는 창종주로서 종정 태허 홍선의 권위를 독보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그의 입적 이전에 준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
1988년 종헌은 종정의 실무 권한을 보다 약화시킨다. 종회 해산권, 포상 및 사면·복권에 대한 권한, 각 원의 원장 임명권은 유지했다. 그런데 종정의 임기를 10년으로 유지하면서도 중임 조항은 삭제했다(<1988년 종헌> 제10조). 기존 태허 홍선 종정의 권한이었던 종단 소속사원 및 종단기관의 재산 감독권과 그 처분 승인권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의 권한이 된다(<1988년 종헌> 제60조). 이러한 종정 권한의 약화 조치들은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은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었다(<1988년 종헌> 제25조). 당연직 이사장이기는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였으며(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정관> 제7조 ①항), 임기는 3년이었다(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정관> 제11조 ①항).
종단의 명칭을 대한불교불입종에서 대한불교관음종으로 개칭한(<1988년 종헌> 제1조) 1988년 종헌은 대각국사 의천을 종조로 하고 입적한 태허 홍선을 창종주로 숭앙 후(<1988년 종헌> 제8조), 그 후임 종정은 종통을 계승하고,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1988년 종헌> 제9조). 또한 개산조인 태허 홍선이 입적하였기에 그를 창종주로 숭앙하는 한편, 그 후임 종정의 임기와 재정권은 약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그 동안 창종주로 지칭했던 태허 홍선을 개산조로 명명하는(<2003년 종헌> 제8조) 한편, 종정이 종통을 계승하고,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지니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종정의 임기는 10년에서 5년 중임으로 변경하였다(<2003년 종헌> 제10조). 임기의 단축은 가장 강력한 권한의 축소라 할 수 있다. 현재 종헌은 종정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 10년 임기를 그 절반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입종 이래 관음종은 종정중심제에서 총무원장중심제로 종무권한이 이동되고 있다. 창종주이자 초대 종정이었던 태허 홍선이 종신제의 임기를 가지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했음에 비해 후대 종정들은 그 임기가 10년 중임에서, 10년 단임으로, 그리고 5년 중임으로 단축되었으며, 종무권한에서는 인사권은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권은 약화되었다. 종정의 권한이었던 종단 소속 사원 및 종단기관의 재산 감독권과 그 처분 승인권이 총무원장이 당연직인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의 권한으로 변경된 것이다.
현 총무원장에 상응하는 교정원장은 최초 종헌에서 원(院)을 대표하여 종회에 대해 종정실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종무권한자이다(<1965년 종헌> 제26조). 종정(宗正)이 종단을 대표하여 종단을 통할하는 종단 전반에 대한 권한자임에 비하여, 교정원장은 교정원을 대표하는 종정(宗政)의 실무 총책임자였던 것이다(<1965년 종헌> 제24조). 교정원장은 종회에서 선출하되, 초대 교정원장은 종정이 직접 임명하였다(<1965년 종헌> 제25조). 교정원장에 대한 종회의 선출은 추천에 그치며(<1965년 종헌> 제18조 3호), 교정원장을 종회에서 추천하면 종정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1965년 종헌> 제12조). 교정원장은 총무부장, 재무부장, 교무부장 각 1명씩을 두어 종무실무를 분장케 할 수 있었으며(<1965년 종헌> 제24조), 이들은 교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종정이 임명하였다(<1965년 종헌> 제25조). 이는 교정원의 부장에 대한 인사권도 교정원장이 아닌 종정에게 있는 종정중심제임을 확인시켜준다. 교정원장은 종정의 유고시에 종정을 대리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6개월을 넘지 못했다(<1965년 종헌> 제27조). 교정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었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잔존기간으로 하였다(<1965년 종헌> 제28조).
1972년 종헌은 교장원장을 최초 종헌의 종정실무 총책임자라는 표현에서 종단행정의 총책임자로 수정했으며, 부장의 정원을 총무부장, 재무부장, 교무부장 3명에서 조직부장을 추가해 4명으로 증원했다(<1972년 종헌> 제26조). 교정원장은 종정이 종사(宗師) 중에서 지명해 종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도록 했다(<1972년 종헌> 제27조). 최초 종헌에는 규정원장에 대한 법계의 제한이 없었으나, 법계를 종사로 한정한 것이다. 1972년 당시 불입종의 법계는 <표 1>과 같이 구분되었다.
| 등급 | 별급 (別級)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명칭 | 도대종사 (都大宗師) | 대종사 (大宗師) | 종사 (宗師) | 종법사 (宗法師) | 법사 (法師) | 대덕 (大德) | 훈덕 (訓德) | 선덕 (宣德) |
도대종사를 급외(級外)의 별급으로 하고, 1급 대종사로부터 7급 선덕에 이르기까지 구분되어 있다. 이들 법계의 지정은 고시에 의하였으며, 연령[세납], 출가연수[법납], 교과과정 이수 등이 기준이었다(<1972년 종도규제법> 제27-34조). 법계 중 별급인 도대종사는 종정만이 될 수 있었으며, 대종사 중에서 종정의 종통을 이은 차기 종정만이 도대종사의 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972년 종도규제법> 제35조).
그런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 불입종의 법계에는 별급인 도대종사가 없다. 1965년에는 종정만이 1급 대종사가 될 수 있었으며, 종사 중에서 차기 종정이 되는 자만이 대종사의 법계를 받을 수 있었다(<1965년 종도규제법> 제35조). 하지만 이후 1972년 종헌에서는 종정인 태허 홍선의 창종주로서의 권위를 강화하고자 종정의 법계는 승급 순서가 있는 여타 법계와는 달리 별급(別給)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론된다.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명칭 | 대종사 (大宗師) | 종사 (宗師) | 법사 (法師) | 강사 (講師) | 훈사 (訓師) | 선사 (宣師) |
교정원의 부장은 교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임면했다(<1972년 종헌> 제27조). 최초 종헌은 종정이 교정원의 부장들에 대한 임명(任命)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72년 종헌은 임명뿐만 아니라 해임의 권한까지도 구체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임면(任免)으로 변경하였다(<1972년 종헌> 제27조). 종정이 종단을 대표하고, 교정원장은 원(院)을 대표한다는 양자의 대표권은 1972년 종헌에서도 변함이 없었고, 종정 유고시 교정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점도 동일했다(<1972년 종헌> 제28조). 하지만 최초 종헌이 교정원장의 임기에 대하여 4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1972년 종헌은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선에 의해라는 단서를 삭제한 것이다.
1972년 종헌의 특징은 교정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정인 태허 홍선의 권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창종주인 태허 홍선의 법계는 여타 법계와는 달리 승급순서를 초월한 ‘별급(別級)’의 도대종사로 정했다는 것이다. 종정 태허 홍선의 창종주로서의 카리스마(charisma)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1979년 종헌은 임기 4년에 중임할 수 있는 종단행정의 총책임자, 종정 유고시 권한 대행자, 교정원의 대표자, 교정원 부장 임명 제청자로서의 교정원장의 기존 지위와 권한을 유지시킨다(<1979년 종헌> 제26-29조). 그리고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조직부장 등 4명의 부장을 두도록 한 것에서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정부장, 사회부장 등 4명의 부장을 두도록 하였다(<1979년 종헌> 제26조). 그런데 기존 조직부장의 업무가 교도회 조직에 대한 실무 관장이었고(<1972년 교정원법> 제11조), 신설 사회부장의 업무가 교도회 조직에 대한 실무와 홍보활동에 대한 실무 관장이라는(<1979년 교정원법> 제11조) 점에서 볼 때 조직부에 홍보활동이 추가되면서 생긴 부서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런데 교정원장은 종정이 ‘종법사’ 중에서 지명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고, 각 부장은 교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임면했다. 종정과 각 부장의 임명 절차는 기존과 동일했지만, 교정원장의 법계 기준이 ‘1급’ 대종사에서 ‘2급’ 종법사로 변경되었다.
1979년 대한불교불입종의 법계는 <표 3>과 같다. 1979년 <종도규제법> 제32조에 의하면, 1급 대법사는 종정 이외에는 될 수 없었다. 1972년 <종도규제법>에서 종정은 승급순서의 범주 밖 존재인 ‘별급’이었는데, 1979년 <종도규제법>에는 승급순서의 범주 내 존재인 ‘1급’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1급 대종사가 2급 종법사로 강급(降級)된 것이다. 이는 창종주인 태허 홍선 종정의 입적을 사전에 준비하여 그에게만 부여했던 ‘별급’의 법계를 후임 종정들에게는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 명칭 | 대법사 (大法師) | 종법사 (宗法師) | 법사 (法師) | 대덕 (大德) | 훈덕 (訓德) | 선덕 (宣德) |
1988년 종헌은 불입종이 관음종으로 변경되면서 종단중앙행정기관도 교정원이 아닌 총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입종 내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태허 홍선이 입적하면서 종단의 명칭을 관음종으로 새로이 선언하고, 종단중앙행정기관도 교정원에서 총무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종정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른 총무원장의 권한 강화이다.
총무원장이 4년 임기의 중임할 수 있는(<1988년 종헌> 제27조) 종단행정 총책임자라는 점은(<1988년 종헌> 제24조) 교정원장과 동일하다. 하지만 교정원장이 원(院)의 대표권자임에 비하여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권자가 되었다(<1988년 종헌> 제25조). 이에 더하여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었다(<1988년 종헌> 제25조). 그리고 교정원장은 종정이 종법사 중에서 지명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했으나, 총무원장은 종정이 임면하고 종회의 인준을 받았다(<1988년 종헌> 제26조). 또한 교정원장은 종정에게 교정원 부장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었으나, 총무원장은 종정에게 제청 없이 직접 부장들을 임면할 수 있게 되었다(<1988년 종헌> 제28조). 총무원장은 교정원장과는 달리 부원장 1명도 둘 수 있었고(<1988년 종헌> 제24조), 부원장은 총무원장과 마찬가지로 종정이 임면하고(<1988년 종헌> 제26조), 4년 임기로 중임할 수 있으며(<1988년 종헌> 제27조), 원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고 각 부장의 자문에 응했다(<1988년 총무원법> 제8조). 그리고 총무원장은 기존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정부장, 사회부장 이외에 감찰부장을 둘 수 있었다(<1988년 종헌> 제24조).
1988년 종헌의 특징은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른 종정의 권한 축소와 총무원장의 권한 강화이다. 첫째, 기존 교정원만을 대표하던 교정원장에 비하여 총무원장은 총무원만이 아닌 관음종을 대표하게 되었다. 둘째, 관음종단 소속 사원과 종단기관의 재산 감독과 그 처분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을 겸하게 되었다. 셋째, 교정원 각 부장 임명에 대한 제청권자에서 총무원 각 부장에 대한 직접적 임면권자가 되었다.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총무원[교정원]은 서울에 둔다’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조항을 없앴다. 하지만 그 외 1988년 종헌에서 대폭 강화한 총무원장의 대표권과 인사권 즉 관음종단 대표권자,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 총무원 직원 인사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종무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종헌이 유지하고 있는 종정의 종무권한은 종회 해산권, 포상 및 사면권·복권권, 각 원(院)의 원장 임면권이다. 이 종무권한들은 최초 종헌부터 종정에게 부여된 것들이다. 불입종 초기 창종조로서의 신성성과 종무행정의 통리권을 동시에 가지고 종단을 대표했던 종정은 태허 홍선의 입적 이후 점차 종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하여 총무원장은 창종 이후 종정을 보좌하고, 종단이 아닌 교정원만을 대표하던 존재에서 벗어나, 태허 홍선 입적 이후는 실질적 종무권한을 가지고 종단을 통리하는 대표권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중앙종무기관
중앙종무기관은 행정부인 총무원, 입법부인 종회, 사법부인 호법원을 총칭하는 용어다. 한국불교의 상당수 종단들은 3권분립의 종단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 중앙종무기관 중 행정부는 앞의 Ⅱ장에서 살펴보았기에 본장에서는 종회와 호법원, 그리고 불교종단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기구인 교육원과 포교원을 분석하기로 한다.
최초 종헌은 종회는 각 지구(地區) 종도(宗徒)들에 의해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65년 종헌> 제13조). 종회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으로 정한 것이다. 종회의원의 정수는 교도(敎徒) 2,000명에 1명의 비율로 정했다(<1965년 종헌> 제14조). 종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1965년 종헌> 제15조), 이는 현재 종헌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장과 부의장은 각 1명씩이었으며, 그 임기는 종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했다(<1965년 종헌> 제16조).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소집했다. 다만 종정 또는 종회의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했다(<1965년 종헌> 제17조).
종회의 의결사항은 1. 종헌개정, 종법제정과 그 개정, 2. 예산·결산 및 재산처분, 3. 교정원장, 호법원장의 천거,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었다(<1965년 종헌> 제18조). 종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됐으며,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했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졌다(<1965년 종헌> 제19조). 종회는 교정원장, 호법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었고(<1965년 종헌> 제20조), 종회의원은 교정원과 호법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었다(<1965년 종헌> 제21조). 입법부인 종회의원이 행정부인 교정원과 사법부인 호법원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한 겸직금지 조항이다.
1972년 종헌은 종회의원의 정수를 종전 2,000명당 1명이라는 비례 정원에서 28명으로 정원을 고정했다(<1972년 종헌> 제16조). 28명은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28품을 상징한다. 그런데 법률적 시각에서는 가변적(可變的) 정수를 고정적 정수로 수정하여 종헌과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최초 종헌과 동일하게 각 1명씩으로 하였다(<1972년 종헌> 제18조). 정기종회는 매년 5월 중에서 12월 중으로 변경했으나(<1972년 종헌> 제19조), 그 소집은 여전히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1972년 종헌> 제19조). 임시종회는 최초 종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정 또는 종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해야 했다(<1972년 종헌> 제19조). 이런 정기종회와 임시종회의 소집 시기와 소집 절차는 현재 종헌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초 종헌에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명칭했으나, 1972년 종헌에서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종회의 의결사항은 1. 종헌 개정, 종법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재산처분 등, 3. 교정원장, 호법원장의 인준,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약간의 자구 수정 이외 종전과 별다른 권한 변동은 없었다(<1972년 종헌> 제20조). 종회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결정함으로써(<1972년 종헌> 제21조), 종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최초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종전에 종회의장이 가졌던 찬반 동수인 경우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권한을 없앴다. 종회는 여전히 교정원장과 호법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었고(<1972년 종헌> 제22조), 종회의원은 교정원과 호법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었다(<1972년 종헌> 제23조).
1979년 종헌은 종회 관련 조항을 1972년 종헌과 동일하게 변동 없이 유지했다.
1988년 종헌은 종회의원의 정수를 50명 이내로 정했다(<1988년 종헌> 제15조). 종회의원의 정수가 최초 종헌의 교도 2,000명당 1명의 비율, 1972년 종헌의 28명에서, 다시 50명 이내로 수정된 것이다. 이 종회의원 정수는 현재 종헌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초 종헌 이래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1명씩 선출했으나,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부의장 중 선임자는 의장유고 시에 의장을 대행했다(<1988년 종헌> 제17조). 종회의 의결사항에 ‘재단법인의 재산 및 회계’가 추가되었다. 이외 1988년 종헌의 종회 관련 조항은 1979년 종헌과 약간의 자구 수정만 있을 뿐 동일하다.
현재 종헌은 종회를 관음종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있다(<2003년 종헌> 제15조). 이는 최초 종헌 이래 보이지 않던 조항으로, 종회의 종단적 권위와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외 종회 관련 조항은 1988년 종헌과 자구 수정 없이 동일하다.
관음종 최고의결기관인 종회는 최초 종헌에서 교도 2,000명에 1명의 비율로 종회의원 정수를 정한 이후 28명에서 현재는 50명으로 수정되었다. 의장과 부의장의 정수는 각각 1명에서 현재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되었다. 정기종회 또한 5월에 개회했으나, 현재는 12월에 열린다. 종회의 의결사항은 최초 종헌에서는 종헌·종법 제·개정, 예·결산 및 재산처분, 교정원장과 호법원장의 추천,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재단법인의 재산 및 회계가 추가되었다. 종회의원의 임기는 최초 종헌 이래 현재까지 4년으로 동일하며, 종회의원의 총무원(교정원)과 호법원의 겸직도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다.
최초 종헌은 종단의 종지 종풍을 진작하고 종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도의 교육, 수련, 포창(褒彰), 징계, 자격고시, 법계 수여 등의 ‘실무’와 종법·종령의 심사 내지 사무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서울에 호법원(護法院)을 두고 있다(<1965년 종헌> 제30조). 호법원에는 원장 1인이 있어 실무를 통할(統轄)하고, 총무부장, 수교부장(修敎部長), 감찰부장 각 1인씩이 있어 실무를 분장했다(<1965년 종헌> 제31조). 호법원은 중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1965년 종헌> 제32조). 호법원장은 종회의 선출에 의하고, 각 부장은 호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종정이 임명했다. 다만 초대 호법원장은 종회의 선출 없이 종정이 직접 임명했다(<1965년 종헌> 제33조). 종정이 호법원장과 각 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호법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었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잔존기간이었다(<1965년 종헌> 제34조). 호법원의 세계예산(歲計豫算)은 교정원과는 별도로 독립집행했다(<1965년 종헌> 제35조).
1972년 종헌은 종단의 종지 종풍을 진작하고,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도의 교육, 수련, 포상, 징계, 자격고시, 법계 수여, 역경(譯經), 수교(修敎), 감찰, 사무 감사 등의 ‘실무’와 종헌 및 제반법령의 제정 및 개폐안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에 호법원을 두도록 했다(<1972년 종헌> 제31조). 최초 종헌과 비교할 때, 수행 실무에 포상, 역경, 수교, 감찰 등이 추가되었다. 최초 종헌은 수행 직무를 종법·종령의 심사로 정하고 있으나, 종헌 및 제반법령의 제정 및 개폐안 작성으로 수정하여 종헌을 포함했다. 부장에는 기존 총무부장, 수교부장, 감찰부장 이외에 역경부장과 재정부장이 추가되었다(<1972년 종헌> 제32조).
호법원장이 교정원장의 종정 유고 시 직무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호법원장은 종정의 유고 시에 교정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종정에게 서면으로써 건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종정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유고 상황인데, 어떻게 종정에게 건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즉, 법리 다툼의 유발 내지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이다.
호법원장은 종정이 2급 종사 중에서 지명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하고, 각 부장은 호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임명하도록 수정했다(<1972년 종헌> 제33조). 종전과는 달리 호법원장의 자격기준으로 종사의 법계를 명시한 것이다. 종사의 법계 지위는 앞의 <표 1>과 같다. 종사는 ① 법랍 10년 이상, ② 법사 또는 종법사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③ 대계(大戒)2)를 봉수한 자이다(<1972년 종도규제법> 제32조). 이외 특별위원회 구성, 호법원장의 임기와 중임, 보궐된 호법원장의 임기, 호법원의 세계예산 독립집행에 대한 조항은 최초 종헌과 동일했다.
1979년 종헌은 호법원의 부장을 수교부장과 감찰부장 각 1인만 두었다. 기존 총무부장, 역경부장, 재정부장의 직위를 없앤 것이다(<1979년 종헌> 제32조). 또한 법리 해석의 문제로 다툼을 유발할 여지가 있었던 종정의 유고시 교정원장의 직무대행을 호법원장이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했다. 중요 안건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했던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호법위원회, 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했다(<1979년 종헌> 제33조). 호법원장의 법계 자격 기준이 2급 종사에서 2급 종법사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앞의 <표 1>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급별 법계 명칭이 변한 것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이다. 호법원에 대한 이외의 사항은 변함이 없다.
1988년 종헌은 ‘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종풍을 진작하고,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포상, 징계, 자격고시, 법계수여, 사무감사 등의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에 호법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이 비문이기는 하지만, 계단의 설치가 추가되는 한편, 교육, 수련, 역경, 수교, 감찰 등의 실무가 제외됐다.3) 또한 종헌 및 제반법령의 제정 및 개폐안 작성 등의 직무도 제외됐다(<1988년 종헌> 제29조).
호법원의 각 부서들을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만 존치했다. 호법원의 분과위원회는 종정추대위원회, 호법위원회, 법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었다(<1988년 종헌> 제30조). 부서의 폐지에 따라 부장들은 없었으며, 원장의 임면은 종정이 하고 종회의 인준을 받았다(<1988년 종헌> 제31조). 이외 호법원장의 임기와 중임, 보궐된 호법원장의 임기, 호법원 예산의 별도 집행에 대한 조항은 이전과 동일했다.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호법원 관련 조항을 1979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초 종헌 이후 1988년 종헌까지는 호법원의 설치 목적과 수행 업무가 여러 번 수정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호법원의 주된 설치 목적은 종단 종지와 종단 기강의 확립이다. 그리고 이의 수행을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포상, 징계, 자격고시, 법계수여, 사무감사 등의 직무가 정립된다. 호법원은 최초 종헌부터 1979년 종헌까지는 부서 체제였으나, 1988년 종헌부터 현재까지는 부서들을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만 존치한다.
교육원은 1988년 종헌에서 신설된 중앙종무기관이다. 1988년 종헌은 종지 종풍을 선양하고, 성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원을 두어 그 산하에 수교부(修敎部)와 역경부(譯經部)를 두고 있다(<1988년 종헌> 제35조). 수교와 역경은 종래 호법원 소관의 업무였는데, 1988년 교육원을 신설하며 수교부와 역경부를 설치한 것이다. 원장이 교육원의 각 부 원무를 통할했으며(<1988년 종헌> 제36조), 교육원은 교육기관 설치 및 장학사업을 할 수 있었다(<1988년 종헌> 제37조). 교육원의 임원선출과 임면은 총무원과 같았다(<1988년 종헌> 제38조).
1988년 종헌의 교육원 관련 규정이 개괄적임에 비하여 현재 종헌은 보다 구체적이다. 현재 종헌은 교육원 산하에 수교부와 역경부를 설치하는 것에 더하여 교육원 관할 하에 ① 기초교육기관인 행자교육원, ②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 ③ 재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 ④ 특수학교 등의 상설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있다(<2003년 종헌> 제35조). 또한 교육원장은 종정이 임면하고, 종회의 인준을 받도록 교육원장의 임면 절차도 명시했다(<2003년 종헌> 제36조). 이외의 조항은 이전과 동일하다.
1988년 종헌은 교육원과 함께 포교원을 신설했다. 포교원은 종지 종풍을 광선유포(廣宣流布)하여 전 종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원활을 기하고, 생활불교로서 안정을 기하도록 지도·감독함을 목적으로 했다. 이 목적은 현재 종헌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포교원은 포교부와 조직부를 두었으며(<1988년 종헌> 제41조), 사회복지를 위한 기관을 둘 수 있었다(<1988년 종헌> 제43조). 포교원장은 각 부의 업무를 통할했으며(<1988년 종헌> 제42조), 포교원의 임원선출 및 임면은 총무원과 같았다(<1988년 종헌> 제44조).
현재 종헌은 포교원장도 교육원장과 마찬가지로 종정이 임면하고, 종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2003년 종헌> 제43조). 포교원을 신설한 1988년 종헌보다 포교원장의 임면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이외의 포교원 관련 조항들은 1988년 종헌과 동일하다.
Ⅳ. 지방종무기관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들은 일반적으로 중앙-교구-말사의 행정조직체계를 형성한다. 이는 국가조직의 중앙정부-지방정부와 유사한 체계로 교구와 말사가 지방정부에 해당한다. 보통 단위 사찰인 말사가 여러 개씩 모여 하나의 교구를 형성한다.
최초 종헌은 ‘교화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교도들의 일상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각 도에 지구를 두고, 각 포교원과 각 사(寺)에 포교구를4) 두고(<1965년 교화법> 제5조), 교도 20세대 단위로 소교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1965년 종헌> 제43조). 또한 각급 교구에는 교구장이 있되, 포교구는 주지나 포교사가 그 장(長)을 겸했다(<1965년 종헌> 제44조). 각 도에 현행 교구에 해당하는 지구가 있었고, 지구 내에 포교원과 사찰이 모인 포교구를 두어 교구장이 아닌 주지나 포교사가 그 장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급 교구장은 교정원장의 천거에 의하여 종정이 임명했다(<1965년 종헌> 제45조).
1972년 종헌은 각 시·도에 교구를 두었다(<1972년 종헌> 제44조). 최초 종헌이 ‘지구’로 표현한 것을 ‘교구’로 수정했으며, ‘각 도’에 두던 것을 ‘각 시·도’에 두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교정원에서 직할했다(<1972년 종헌> 제44조). 각 시·도 교구에 교구장을 두어 관할 사원의 포교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신앙지도를 하되 교구에는 주지 또는 포교사가 그 장을 겸했다(<1972년 종헌> 제45조). 최초 종헌의 ‘각 포교원과 각 사(寺)에 포교구를 두고’라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교구에는 주지 또는 포교사가 그 장을 겸한다.’라는 문구를 두어서 교구장과는 별도로 주지와 포교사가 기존 포교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교구장은 교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임면했다(<1972년 종헌> 제46조).
1979년 종헌은 교구 관련 조항을 1972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1988년 종헌은 각 시·도 교구에 종무원(宗務院)을 두되, 서울특별시는 총무원에서 직할하게 했다(<1988년 종헌> 제51조). 각 시·도 교구의 종무원장은 관할 사원의 포교업무와 소속 말사의 종무행정을 지도감독했다(<1988년 종헌> 제52조). 각 교구의 종무원장은 총무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임면했으며, 임기는 3년이었다(<1988년 종헌> 제53조).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교구 관련 조항을 1988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초 종헌은 종단 소속 사찰이 교화, 수련, 의식집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1965년 종헌> 제37조). 소속 사찰 경내에는 상기한 목적 이외의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했다(<1965년 종헌> 제38조). 주지는 재산관리와 포교 및 법요집행을 관장했다(<1965년 종헌> 제39조). 주지는 소속 종도들에 의해 선출된 당해 사찰의 재적 법려(法侶)5) 또는 창건주가 추천하는 법려를 종정이 임명했다. 다만 사설사암의 주지는 창건주의 추천에 의하여 그리했다(<1965년 종헌> 제40조). 주지는 종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찰의 운영관리에 알맞은 직제를 편성하여 그 직무를 분장시킬 수 있었다. 단, 직제의 창설 또는 개폐, 임원의 임면은 지체 없이 교정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1965년 종헌> 제42조).
1972년 종헌은 종정이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한 자를 주지로 임명케 했다(<1972년 종헌> 제42조).
-
주지 자격을 구비한 자
-
당해 사원의 소속 종도 <승니 및 교도>들에 의하여 선출된 승니
-
사설사원에 있어서는 창건주가 추천한 승니
-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가 대표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자격에 의하여 주지·주지서리·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
사설사원의 주지계승은 창건주의 문도에게 계계승승 상속권을 전 4항에 의하여 인정한다.
이외의 사원 및 주지에 대한 사항은 최초 종헌과 동일하다.
1979년 종헌은 사원 및 주지 관련 조항을 1972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1988년 종헌은 주지의 임면을 종정이 아닌 총무원장의 권한으로 변경했다(<1988년 종헌> 제49조). 그리고 주지 자격 요건을 다음의 각호와 같이 수정했다(<1988년 종헌> 제49조).
-
주지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임면한다.
-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는 주지, 주지서리 또는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사설사원의 주지계승은 창건주의 추천에 의하여 계계승승 상속권을 인정한다.
이전 종헌의 주지 임명 요건 중 ‘사설사원 창건주가 주지, 주지서리, 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조항이 유지됐다. 하지만 ‘당해 사원의 소속 종도 <승니 및 교도>들에 의하여 선출된 승니’ 조항은 사라졌다. 그리고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가 추천한 승니’와 ‘창건주의 문도에게 주지계승 상속권 인정’이 병합됐다. 이외의 사원 및 주지에 대한 사항은 1979년 종헌과 동일하다.
현재 종헌은 다시금 창건주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주지 임명 요건 중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창건주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2003년 종헌> 제49조). 그 밖의 사원 및 주지에 대한 조항은 1988년 종헌과 동일하다.
최초 종헌 이래 현재 종헌에 이르기까지 사원 및 주지와 관련해서는 사설사원에서 창건주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공찰이 적고 사설사원이 많은 종단들의 입장에서는 창건주의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탈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사설사원의 종단 가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종단의 교세 약화는 물론 종단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기에 관음종도 창건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재정·회계와 포상·징계
최초 종헌은 사찰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을 삼보호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1965년 종헌> 제49조). 그리고 그 재산은 종정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없었으며, 기채도 동일했다. 종정의 승인 없는 상기 모든 행위는 일체 무효로 했다(<1965년 종헌> 제50조). 종단재산관리에 대한 종정의 승인은 1979년 종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1965년 12월 8일부터 1988년 8월 9일까지 유지된 것이다. 당시 종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인데(<1965년 종헌> 제51조), 부처님오신날을 고려해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교정원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종회의 정기총회 초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했다(<1965년 종헌> 제53조). 종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거나 안했을 경우 교정원은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해야 하고, 부득이 변경시켜야할 경우에는 종정의 직접 재가를 얻어야 했다. 호법원도 동일했다(<1965년 종헌> 제53조).
1972년 종헌은 사원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을 삼보호지 이외의 목적에 여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재산관리는 관등록과 동일한 규정으로 종단의 재산보호를 받도록 했다(<1972년 종헌> 제51조). 재산을 삼보의 보호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는 한편, 그 재산은 정부의 불교재산관리법을 적용하여 종단이 보호했던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5월 31일 시행됐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1965년 종헌(최초 종헌)이 아닌 1972년 종헌에서 관등록 즉, 불교재산관리법을 적용하여 종단이 재산보호를 한 것은 최초 종헌의 미비점을 후에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연도는 종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서 일반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다(<1972년 종헌> 제53조). 종단의 수입이 증가하는 부처님오신날을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반 사회의 회계연도를 준용한 것이다. 이외의 재정·회계에 대한 사항은 이전 종헌들과 동일했다.
1979년 종헌의 재정·회계는 1972년 종헌과 전반적으로 동일했다.
1988년 종헌은 종단에 등록한 사원 및 재단법인에 속한 재산관리는 <종헌>과 <종단재산관리법> 규정에 따라 재산 보호를 했으며(<1988년 종헌> 제58조), 사설사원의 재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했다(<1988년 종헌> 제59조). 재단의 재산을 매각, 양도, 기채, 담보제공 시는 재단법인의 규정에 따랐다(<1988년 종헌> 제60조). 이전에는 종정의 승인 없는 상기 재산 관련 행위는 무효였지만, 재단법인이 설립되었기에 그 규정을 따르게 한 것이다. 이 시기 불입종으로부터 관음종이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 설립된다. 총무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정기종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다(<1988년 종헌> 제63조). 그런데 이전에는 그 예산안이 정기종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종정의 재가를 받아야 했지만, 1988년 종헌은 총무원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했다(<1988년 종헌> 제64조).
현재 종헌은 1988년 종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단 수입의 종류와 공과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 종단의 재정 수입은 기본재산수입, 사찰분담금, 승려의무금, 사업수입금,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있다(<2003년 종헌> 제64조). 총무원은 종단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찰, 승려 및 종단 공직자에게 각종 공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찰 및 승려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2003년 종헌> 제64조).
1965년 불입종의 창종으로부터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의 출범 전까지는 종정이 재정에 대한 전권(全權)을 가지고 있었다. 종정이 매각, 기부, 담보제공, 기채 및 기타 처분에 대한 승인권을 가졌다. 상기 모든 행위에 대해 종정의 승인이 없으면 일체 무효였다. 또한 총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종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야 했는데, 의결을 얻지 못하면 이 역시 종정의 직접 재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의 출범 후부터는 상기 종정의 재정권이 재단법인의 권한으로 이양된다. 관음종 출범 이듬해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단 재산은 재단 재산이 되었고, 그 재산의 매각, 양도, 기채, 담보제공은 종정의 승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총무원이 종단 예산안을 종회에 제출 시 의결을 받지 못하면 직접 종정의 재가를 얻어야 했던 것도 종정의 재가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다.
최초 종헌은 종단원(宗團員)의 포상·징계는 호법원의 건의에 의하여 종정이 실행하도록 했다(<1965년 종헌> 제55조). 포상은 문서표창, 상품수여, 법계승진 등으로 구분했다(<1965년 종헌> 제56조). 징계는 사참(事懺),6) 정권(停權), 법계강등, 제적 등으로 구분했다(<1965년 종헌> 제57조).
포상·징계에 대한 최초 종헌의 이 규정들은 1979년 종헌까지 유지된 후 1988년 종헌에서 개정된다. 우선 기존의 ‘종단원의 포상 및 징계는 호법원의 건의에 의하여 종정이 실행한다.’에서 ‘종정이 실행한다.’를 삭제하여 ‘종단의 포상 및 징계는 호법원의 심의에 따른다(<1988년 종헌> 제65조).’라고 했다. 호법원의 심의는 호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1988년 상벌법> 제3조). 호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포상과 징계는 총무원 또는 호법원에서 행했다(<1988년 상벌법> 제5조, 제7조). 다만 징계는 종정의 선계문(宣啓文)에7) 의하여 총무원장이 대행할 수 있었다(<1988년 상벌법> 제8조). 기존 종정의 포상 및 징계 실행 권행이 종정의 선계문을 조건부로 해서 총무원 또는 호법원으로 이양된 것이다. 이외 1988년 종헌은 ‘포상은 표창, 법계승진 등으로 구분한다.’고(<1988년 종헌> 제66조) 하여 포상의 종류에서 상품수여를 제외했다. 하지만 징계는 종전처럼 사참, 정권, 법계강등, 제적의 네 종류를 유지했다.
현재 종헌은 포상과 관련해서는 1988년 종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징계의 실행에 대해서는 총무원 또는 포교원이 행하던 것을 총무원만이 행하도록 했다(<2003년 상벌법> 제9조). 하지만 여전히 징계는 종정의 선계문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3년 상벌법> 제10조). 그런데 징계의 실행에 있어서는 ‘총무원이 행한다’는 것과 ‘종정의 선계문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치되는 조문이다. 전자는 징계의 실행 권한이 총무원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종정에게 있으나 총무원장이 대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두 조문은 법리 충돌이 있을 수 있기에 추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언
율장이 불교교단의 이상적 생활 규범이라면 종헌은 한국불교종단의 현실적 생활 규범이다. 현재 한국불교종단들은 종헌을 최고의 규범으로 삼고 있다. 종헌은 종단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 포상과 징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음종은 태허 홍선이 불입종을 창종한 이래 5번에 걸쳐 제·개정됐다. 종헌 제·개정의 핵심은 종정 종무권한의 강화와 약화라고 하겠다. 창종주인 태허 홍선이 생존 시에는 종정의 종무권한이 점차 강화됐음에 반하여 그의 사후에는 점차 약화됐다. 태허 홍선이 종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인사권과 재무권이 종정에게 집중된데 반하여, 그의 사후에는 총무원장에게로 그 권한들이 이양된 것이다.
종헌은 이와 같이 종단적·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종단의 조직구조와 권한구조를 정한다. 현행 관음종 종헌은 개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됐다. 물론 최고 상위법인 종헌을 빈번하게 개정하는 것은 종단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단 내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종헌 역시 종단 운영에 곤란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종단의 조직구조와 권한구조에 따라 종단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기에 내외의 변화에 따라 종헌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관음종 종헌이 개정된 2003년 이래 한국사회와 관음종단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종단 내외적 상황에 맞추어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관음종 종헌에는 ‘종헌 조문들 간’ 불일치와 ‘종헌과 종법 간’ 조문 불일치 등이 존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종단 소속의 사원 및 재단법인의 재산보호 규정인 종헌 제60조는 그 근거를 종헌 제49조에 두고 있지만, 종헌 제49조는 재산보호와는 무관한 건축물 축조 금지 조항이다. 즉, 종헌 조문들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단재산관리법> 제1조는 그 제정 근거를 종헌 제58조에 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종헌 제58조는 종단재산관리와는 무관한 계단(戒壇)에 관한 조항이다. 즉, 종헌과 종법 간 조문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종헌은 이와 같이 종헌과 현실의 불일치, 종헌 조문들 간 불일치, 종헌과 종법 간 조문 불일치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아무쪼록 종헌이 종단 운영의 최상위법에 걸맞은 권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관음종이 ‘종헌개정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